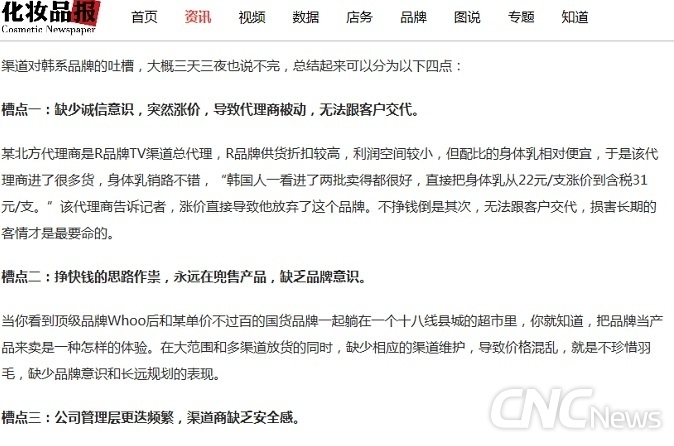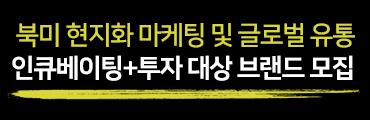한국 화장품에 대한 비판의 소리가 잦아지고 있다. 최근 화장품보(化妆品报) 리나(李娜) 기자는 ‘한국 화장품 퇴조, 한 시대가 가고 있다’는 기사에서 “대리상들 사이에서 K-뷰티에 대한 관심과 호의가 줄고 있다”고 전했다.
기사는 “한국 브랜드의 문제점은 3일 밤낮을 얘기해도 끝나지 않을 정도”라며 대표적인 문제점 4가지를 소개했다.
첫째, 신의성실이 부족하다. 갑작스런 가격 인상으로 대리상을 판매에 소극적으로 만들면서도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는다. “R브랜드 바디로션이 공급할인가도 높고 이윤도 낮았지만, 이를 대리상에게 권유해 많은 물량을 매입하게 했다. 그런데 물량이 많아지니 한국 브랜드는 개당 22위안짜리 바디로션을 세금포함 31위안으로 인상하며, 설명도 하지 않았다. 돈을 벌고 안 벌고는 다음 문제다. 오랜 고객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끔찍한 일”이라는 한 북부지역 총대리상의 경험을 소개하고 있다.
둘째, 빨리 돈을 벌기 위한 생각으로 몰래 나쁜 짓을 하며, 제품을 팔면서도 브랜드 의식이 결핍됐다. 정상급 브랜드인 Whoo(后)의 100위안 제품이 슈퍼마켓에서는 한 개에 18위안이 붙어 있다. 검색해보면 안다. 브랜드 제품이 여러 채널로 출하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가격 관리가 안돼 혼란을 야기는 것을 깃털처럼 가볍게 여긴다. 장기적인 기획과 브랜드 의식이 부족하다.
셋째 기업 경영진 교체가 잦아 대리상이 불안해한다. 한국 본사의 경영문제는 종종 중국 채널이 비판을 받는다. 한국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6. 3. 1~2019. 3. 27) 20개 기업의 경영진 37명이 교체됐다. 고위 임원이 동요하니 중국 대리상들이 불안을 느낀다. 경영 중에 “한국 화장품기업 간부가 ‘나는 사직했다’는 말을 남기고 떠나는 것”을 상상한다는 것.
넷째 토사구팽이 일반적이며, 시야가 좁다. 한국 브랜드사는 중국 채널에서 브랜드를 키우고 인지도 상승 및 시장점유율을 확대하다가 성숙해지면 직판을 하겠다고 선언한다. 이는 한국 브랜드사의 공식이다. 대리상들은 “다른 사람을 위해 아들을 대신 키워줬다”는 분위기다. 운영상의 결함 외에도 정치적 위험은 한국 브랜드의 발전이 ‘시한폭탄’이라는 점을 말해준다. 아모레퍼시픽은 사드 이후 매출액이 5.6조원(‘16년)→5.3조원(’18년)으로 축소됐다.
중국 유통채널은 제조사→총대리상→1·2급 대리상→대리상(经销商)→소매유통 마트·슈퍼의 단계를 거치며 거미줄처럼 깔려 있다. 한국 화장품기업들은 유통채널별로 가격관리와 유통질서 확립에 애를 먹는다. 우리나라에서는 중국 대리상의 마케팅비와 지분 등 과도한 요구가 문제가 되고 있지만, 정작 중국에서는 한국 브랜드사의 난맥상을 얘기하고 있다.
중국 화장품시장에서 한국 기업이 직판을 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로드숍, 올리브영이 줄줄이 중국에서 철수한 사실이 이를 잘 말해준다. 그렇다면 대리상을 통해야 K-뷰티의 활로가 뚫린다고 볼 때 정작 한국화장품의 최일선 판매인 대리상들로부터 평판이 나쁘다는 건 문제다.
현재 K-뷰티의 인기가 시들해지고 있다는 사실은 “동대문에서 일본 뷰티 제품을 구해달라”는 웨이상의 주문이 빈번하다는 데서도 드러난다.
리나 기자는 기사 첫 대목에서 “현재 화장품 강호(江湖)에서는 수입화장품에 대해, 일본 브랜드는 장인정신으로, 미국 브랜드는 기술 선도로 인식된다. 프랑스는 문화에서 앞서며, 독일 브랜드는 엄격함으로 유명하다. 호주 브랜드는 자연 이미지를 심는데 성공했다. K-드라마로 인기를 얻은 한국 메이크업은 더 이상 환영받지 못하며 미래도 걱정스럽다”고 했다.
중국인들 사이에 각인된 선진국 화장품의 이미지는 특징이 있다. 하지만 K-뷰티는 K-드라마의 인기에 편승됐을 뿐이라는 지적은, 대리상들이 말하는 정상급 브랜드인 LG생활건강의 ‘후’마저도 브랜드 의식이 없다는 데에서 확인이 된다. K-뷰티만의 독특한 ‘뭔가’가 없다는 지적이다.
티몰글로벌 관계자의 ”K-뷰티는 치고 빠지기를 잘하는 패스트(fast) 코스메틱이다. 미국·유럽은 천천히 진행한다. 일본은 지킬 건 지켜가는 스타일이다“라는 언급은 한국 브랜드사의 중국 시장을 바라보는 스타일을 보여준다.
탐나는 중국 시장을 놓고 돌다리가 튼튼한지, 넘어가기에 위험하지 않은지, 너무 미끄러워 다치지 않을지 신경 쓰지 않는다. 먼저 건너가 취하지 않으면 다른 기업에 뺏길 수 있다는 생각에 일단 뛴다. 그러다가 운 좋게 재미를 보는 기업이 나온다. 하지만 중간에 미끄러져서 넘어지고, 부상을 당하거나 물에 빠지는 기업도 부지기수다. 그래도 뒤를 따르는 기업들은 계속해서 달려간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High Risk High Return)'이다. ’고 위험‘이 두드러진다. 이에 비하면 일본은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Low Risk Low Return)‘이다.(우수근, “한중일 힘의 대전환’에서 인용)
대리상들은 한국 브랜드사의 성신(誠信) 부족과 K-뷰티만의 ‘뭔가’가 없다는 비판을 내놓았다. 이것이 K-뷰티의 문제점이 아니라고, 누군가 말했으면 좋으련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