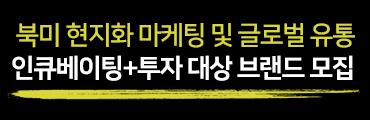성분·효능을 중시하는 소비자의 화장품 구매 이유는 ‘기능성’으로 모아진다. 하지만 시중에는 어느 화장품이나 똑같은 ‘기능’을 강조하는 미투(me too) 제품이 범람 중이다.
대한화장품협회에 따르면 “‘22년 기능성화장품 생산실적은 4.6조원으로 전체 화장품의 3개 중 1개가 기능성화장품이었다. 이중 95% 이상이 보고 품목이며 동일한 효능 고시 성분을 사용한 품목(1호 보고)이 90% 이상”이라고 밝혔다. 이는 기능성화장품의 획일화를 초래한다는 설명이다.
27일 공개된 올해 상반기 기능성화장품 심사 건수에서도 이런 문제점은 되풀이됐다. 총 심사 건수는 524건으로 전년 대비 39건(8%) 증가했다. 그러나 신규 주성분은 주름개선 2개, 탈모완화 5개 등 7건으로 전체의 1.3%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나머지는 고시성분을 사용한 미투(me too) 제품만 양산했음을 짐작케 한다.
신규 주성분 심사는 (’21년 상) 1건 → (’21년 하) 4건 → (’22년 상) 9건 → (’22년 하) 7건 → (’23년 상) 7건 등으로 답보 상태다.
그 이유로 기업이 새로운 유효성분이나 기술을 개발하고 막대한 비용을 투입해 임상시험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어도 다시 복잡한 정부의 검증 절차를 밟아야 하는 사전심사제도가 꼽힌다. 과도한 규제 준수 탓에 기업의 신원료·신기능 연구개발은 제한된다. 그러다보니 차별성 약화와 경쟁력 상실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거듭된다.
효능 검증은 시장에 맡기고 기업은 효능 관련 과학적 증거를 확보하고 품질과 안전성 책임을 자율적으로 지게 하자는 글로벌 스탠다드로 가자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또 기능성을 9개로 한정하는 데서 오는 한계도 있다. 일본이 56개의 효능 광고가 가능한 점과 미국, 유럽의 경우 기업 책임에 중점을 두고 시장 자율로 규제하고 있다.
식약처는 상반기 기능성화장품 심사 품목 중 국내 제조 466건, 수입 58건으로 제조 비중이 88.9%로 나타났다고 했다. 작년 상반기 83.5%. 하반기 86.3%에 비해 국내 제조 비중이 증가하는 경향이라곤 하지만 결국 유사제품(me too)이 매년 브랜드만 바꿔 달고 시중에 풀린다는 반증이다.
현재 내수와 수출 양쪽에서 K-뷰티 경쟁력은 도전 받고 있다. ‘탈 중국, 글로벌 다변화’의 키워드는 당연히 ‘혁신’이다. ‘성분·효능‘의 연구 개발이 뒷받침 되지 않고 조성물 함유량 특허와 마케팅에 의존하는 현실은 암울하다. K-뷰티의 트렌디(trendy)가 쿠션, BB크림, 마스크팩 등 기존 제품의 융합+mix 로 이어졌다고 볼 때 이젠 ‘갈색병’처럼 제대로 된 신원료·신기술에 의한 혁신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기능성화장품 폐지 논의는 ‘2023 점프업 K-코스메틱 협의체’의 주요 안건으로 올라와 있음은 다행이다. 화장품산업의 과잉 생산과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려면, 기업 자율 책임 하에 '혁신을 불어넣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참고로 기능성화장품 생산실적은 '22년 4.6조원으로 '16년 4.4조원 수준으로 후퇴했다. 겉으로만 기능성을 강조할 뿐 유사제품만 넘쳐나니 정작 소비자는 외면한 결과다.
한편 상반기 기능성화장품 심사 건수에서 △자외선차단 192건 △삼중기능성(미백자외선차단 192건 △삼중기능성(미백·주름개선·자외선차단) 92건 △탈모증상 완화 72건 △이중기능성(미백·주름개선) 36건 순으로 나타났다.
단일기능성과 삼중기능성의 심사 건수는 각각 증가(22%↑, 14%↑)했지만 이중기능성은 감소(37%↓)했다. 2020년에 처음 기능성화장품으로 지정된 ‘피부장벽 기능을 회복하여 가려움 등의 개선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 심사건수는 ‘21년 3건 → ’22년 9건 → ‘23년 상반기 11건으로 증가세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