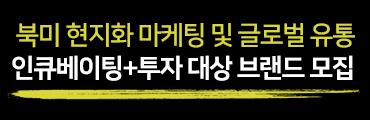2017년 중국 ‘밭’이 달라졌다. 어떻게 달라졌는지, 또 얼마나 달라질지는 워낙 중국 경제가 럭비공 같아 예측이 어렵다. 하지만 방법은 있다. 중국의 변화 속 불변 요소를 찾아내어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다. 한국 화장품 업계가 꼭 알아야 할 중국의 불변 요소는 무엇일까?

밭이 변하면 뿌리는 씨앗도 바뀌어야 한다. 중국 ‘밭’의 변화는 한국 화장품 기업들에게 지난 3년을 잊어야 한다고 충고한다. 그리고 ▲새롭게 ▲다른 씨를 뿌려야 한다는 사실을 일깨우고 있다.
A업체는 호남성TV와 컬래버를 통한 매출 성장 계획이 무산되면서 중국 마케팅에 대한 고민이 크다. 당장은 관망세를 유지하며 비용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는 소극적 전략을 펴고 있다.
사드 보복이 15개월째 이어지면서 장기화에 따른 피로감으로 업계가 점차 골병이 들까 우려된다. 2분기 이어 3분기에도 영업이익 반토막 소식이 이어지고 있다.
아모레퍼시픽은 아직 바닥이 안보이고 LG생활건강도 고전이다. ODM사들도 중국 현지 공장 가동률이 예상보다 부진하다.
사드 보복으로 화장품업계가 긴장감 넘치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그러다보니 향후 중국 특수는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미국의 투자가 워런 버핏은 “썰물이 오면 누가 벌거벗고 헤엄쳤는지 알 수 있다”는 투자 격언을 말했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말처럼 K뷰티의 취약점이 점차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중국 특수 없는 K뷰티’를 가상하고 전략을 짤 때가 왔다.
먼저 전제되는 상황을 살펴보자. 뒤집어 말하면 ‘사드가 준 선물’이라는 관점에서 보자.
코트라는 ‘반면교사-중국 홍색공급망의 영향 및 사례’ 보고서에서 “중국이 종래 수입하던 중간재의 자국산 사용비중을 높이면서 기존 공급망에서 대만‧한국이 담당했던 부분을 중국산으로 급속히 대체된다”고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홍색공급망(Red Supply Chain)이란 ‘중국제조(中國製造) 2025’에 따른 ‘중국 내 제조(Made in China)→중국과 함께 제조(Made with China)→중국을 위한 제조(Made for China)로 변화하는 정책이다. 즉 화장품의 경우도 이를 그대로 적용하면 나중에 한국 기업들의 철수도 가정해야 한다.
중국의 내수진작책은 내수가 경제 성장을 견인한다는 점에서 K뷰티에겐 기회일 수 있다. 반면 중국의 질검총국 등의 시스템 정비는 중국의 스탠다드와 법규 준수를 필요로 한다. 또 자국산업 보호책은 예전에 우리나라가 했던 그 방식 그대로여서 점차 규제 강화는 불가피하다. 앞서 얘기한 홍색공급망도 자국산업 보호책이다.
한마디로 ‘포스트 사드’시대다. 즉 지난 3년의 특수는 끝났고 쉽게 돈 버는 시대도 저물었다는 얘기다. 이 말은 한‧중 화장품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준비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한다.
즉 중국을 ‘제2의 내수시장화’하려는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중간재는 대체할 수 있지만 품질이 우수한 소비재는 바꾸기 어렵다.
현재 K뷰티의 중국 화장품 시장 점유율은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5% 내외로 추산된다. 이를 20~30%대 이상으로 확 키워야 한다. 사드 보복이 소비자 행동으로까지 이르더라도 중국 내 시장 점유율이 압도적이면 소비자들이 불편해 할 수밖에 없다. 가품에 시달리는 중국 소비자들의 마음을 K뷰티가 더욱 확실하게 잡아야 한다.
대한화장품협회 장준기 상무는 ‘K뷰티 현황’ 보고에서 “2016년 프랑스와 한국산 화장품의 격차는 불과 몇 천만 달러로 좁혀졌다”며 “사드 변수에도 조금 노력한다면 중국 수입화장품 1위는 올해 가능하다”고 말했다.
현재 화장품 기업은 1만개 시대를 열었다. 상위 100대 기업을 제외하곤 대부분 5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이다. 대표적인 소비재업종인 화장품은 ‘다품종 소량생산’이 가능한 중소기업에 유리하다. 기술과 아이디어‧콘셉트로 틈새시장을 노린다면 중국 화장품 시장은 중소기업에겐 블루오션이 될 수 있다.
그러는 한편 중국 시스템에 맞는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또 불법 유통과 가격질서를 정상적으로 회복시켜야 한다. 만일 중국 밴더들의 물량 떼기에 밀려 한국 업체끼리 출혈 경쟁을 벌인다면 앞서 얘기한 홍색공급망에 의한 ‘동북 4성’ 생산기지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결론은 하나. K뷰티의 우수한 품질력과 브랜드 파워에 승부를 거는 수밖에 없다. 그리고 우리는 그 방법을 안다. 최근 발족한 화장품발전사업단은 기업의 R&D 환경을 만들어주고 위생허가 등 제반 규정의 절차와 비용을 지원하는 등 대책 수입에 들어갔다.
한편 K뷰티를 이끄는 젊은 사업가들의 창의력을 보완하고 실패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제도 마련도 필요하다. K뷰티의 민낯이 드러난 요즘이 경쟁력 강화에 힘쓸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