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2월 6일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12월 13일부터 3박 4일간 중국을 국빈 방문한다고 밝혔다. 중국 다수 매체가 이를 속보로 보도, 한중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또 12월 14일 중국 베이징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한다고 12월 11일 청와대가 공식 발표했다. 화장품 관계자들은 사드 보복 조치 완화 가속을 예상하고 있다. 수입 관세 인하 소식도 화장품 대 중국 수출에 희망적이다. 중국 재정부는 화장품과 생활용품 등 소비재에 대한 수입 관세 인하를 12월 1일부터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187개 수입 품목의 관세가 평균 17.3%에서 7.7%로 인하된다. 화장품에서는 색조 제품 일부가 적용된다. 매니큐어 등 네일 제품이 15%에서 5%, 아이 립 메이크업 제품과 향수가 10%에서 5%, 화장용 브러시는 25%에서 8%로 각각 낮아진다. 지난해 중국 정부의 색조 화장품 소비세 인하에 이어 수입 관세 인하로 국내 화장품 기업의 수출 호조가 전망된다. 중국 색조 화장품 시장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연평균 11.2% 상승했다. 화장품 중 성장률이 가장 빠르다. 유로모니터는 2016년 중국 시장 내 10대 색조화장품 브랜드

2018년 화장품 업종의 가파른 회복이 전망됐다. 그 이유는 세 가지다. 첫째 한·중 관계 개선이다. 12월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과 시진핑 주석의 평창올림픽 참가 여부에 따라 훈풍이 기대된다. 둘째 중국 시진핑 2기 지도부의 신창타이 경제로의 방향 강화다. 셋째 중국 소비자심리지수가 20년 만에 최고 수치 도달했다는 점이다. 12월 5일 노영민 주중 대사 신임장 제정에서 중국 시진핑 주석은“최근 한중관계가 양호하게 발전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과 회담을 기대하고 있으며, 회담을 통해 한중 관계 발전을 비롯한 양국의 공통 관심사에 대해 깊이 있는 의견을 교환하고 많은 공동인식에 도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고 주중 한국 대사관이 밝혔다. 이보다 앞선 2일에는 사드 갈등 이후 첫 중국인 단체관광객 32명이 입국했다. 베이징에서 출발한 유커들은 4박 5일 동안 경복궁, 한옥마을 등을 둘러보는 일정을 소화했다. 유커의 귀환을 촉진하는 강력한 수단은 정부가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중국인에게 체류기간 15일 동안의 무비자 입국 허용 방침이다. 12월 1일부터 2018년 3월말까지 한시적인 조치다. 이 때문에 유커의 인바운드 회복 기대가 커졌다

2017년 솽스이(双十一, 11월 11일 중국 인터넷 쇼핑몰 할인행사의 날)에서의 한국 화장품 판매 현황 분석을 보면 아모레퍼시픽이 651억원으로 전년 대비 53% 증가했다. 코트라의 칭다오무역관 조사에 따르면 LG생활건강 ‘후’는 138억원을 달성 2016년 대비 54% 증가했다. 또 숨‘은 한 시간 반만에 18억원을 달성하는 등 총 44억원을 판매해 최고치를 기록했다. 솽스이의 온라인 화장품 판매액은 205억7000만위안이다. 그중 스킨케어가 66.6%, 색조화장품 17.%, 바디케어 15.9%를 차지했다. 주목할 점은 각 부분에서 세트 제품이 큰 인기를 모았다. 이번 솽스이 특징은 △세트 제품 판매 호조 △외국 브랜드 시장 점유율 증가 △고급 브랜드 인기 △텐마오 플랫폼 비중 최고 등이었다. 먼저 세트제품의 경우 세트 제품을 원하는 소비자 수요에 맞춘 판매촉진용 세트제품(SKU, Stock-keeping unit)이 많이 나왔다. 스켄케어 제품 중에서는 페이셜 케어 세트 판매율이 60.1%로 높게 나타났다. 다음이 마스크팩 25.2%, 스킨제품 5.9% 순이었다. 바디케어 제품 중에서는 샴푸 세트 판매율이 34.1%였다. 2017년 T0p 10 중 외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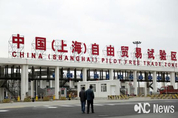
사드 갈등이 봉합되면서 중국이 시행하는 상하이 자유무역구에 관심이 높다. 특히 푸동신구는 비특수용도 화장품 허가제에서 등록제로의 전환 시범 구역이어서 소요시간 단축이 매력이다. 최근 제품을 론칭한 K업체는 중국 진출을 위해 상하이 푸동신구에 등록 신청 준비 중이다. K대표는 “검사보고서를 받는 즉시 빠른 시일 내 중국에 진출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의 국가식품약품감독총국(CFDA)과 질검총국은 올해 1월 상하이 푸동신구를 비특수용도 화장품의 등록제 시범구역으로 지정, 2017년 3월 1일부터 2018년 12월 21일까지 시범운영한다고 발표했다. 특수용도 화장품은 주로 육발·염색·파마·탈모·미유·건미·탈취·미백·선블록 등 기능를 가진 제품을 말한다. 비특수용도 화장품은 앞서의 기능이 없는 제품을 지칭한다. 상하이 푸동으로 수입되는 비특수용도 화장품이 수입될 때 허가가 아닌 등록만으로 통관이 가능해져 소요되는 시간이 단축됐다. 실제 시행 9일만인 3월 9일 랑콤청결마스크가 1호, 시세이도 나스 립펜슬이 2호가 등록했다. 반면 한국 기업의 푸동신구 등록 이용은 저조하다. 푸동신구에는 유럽, 미국, 일본 등 화장품 기업들이 밀집해 있는 반면 한국

중국 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가 막을 내리면서 한·중 해빙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11월 26일 중국 허베이(하북)성의 한 여행사 웹사이트에 한국 단체 관광 모객 글이 올라왔다는 소식에 증권가 화장품주는 일제히 급등했다. 이 여행사는 페리편 한국행 상품으로 서울관광은 1인당 1480~2480위안(25만~42만원), 제주관광은 3080위안(52만원)이다. 하지만 베이징, 상하이 등의 대형 여행사들은 여전히 한국 상품을 팔지 않고 있다. 다만 중국 최대 온라인 여행사이트가 한국 관광상품 재개를 검토 중이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 씨트립과 롯데호텔은 실무협의를 진행 중으로 알려졌다. 한편 닛케이신문 보도에 따르면 지난 9월 중국의 몇몇 지역에서 일본 그룹투어 제한 통보가 지시됐다고 알려졌다. 이 영향으로 시세이도, 코세 등 일본 화장품업체의 주가 하락 소식도 있다. 일본관광 제한이 한국 관광 완화 분위기와 맞물리고 있다. 지난 2012년 중일 센카쿠 분쟁 때도 그해 열린 11월 18차 당 대회 후 양국 긴장 완화를 밝히면서 일본 제품 판매가 회복됐기 때문이다.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손성민 연구원은 “사드 보복 해제는 3·3 한한령(限韓令) 해제가 필

2017년 중국 ‘밭’이 달라졌다. 어떻게 달라졌는지, 또 얼마나 달라질지는 워낙 중국 경제가 럭비공 같아 예측이 어렵다. 하지만 방법은 있다. 중국의 변화 속 불변 요소를 찾아내어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다. 한국 화장품 업계가 꼭 알아야 할 중국의 불변 요소는 무엇일까? 밭이 변하면 뿌리는 씨앗도 바뀌어야 한다. 중국 ‘밭’의 변화는 한국 화장품 기업들에게 지난 3년을 잊어야 한다고 충고한다. 그리고 ▲새롭게 ▲다른 씨를 뿌려야 한다는 사실을 일깨우고 있다. A업체는 호남성TV와 컬래버를 통한 매출 성장 계획이 무산되면서 중국 마케팅에 대한 고민이 크다. 당장은 관망세를 유지하며 비용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는 소극적 전략을 펴고 있다. 사드 보복이 15개월째 이어지면서 장기화에 따른 피로감으로 업계가 점차 골병이 들까 우려된다. 2분기 이어 3분기에도 영업이익 반토막 소식이 이어지고 있다. 아모레퍼시픽은 아직 바닥이 안보이고 LG생활건강도 고전이다. ODM사들도 중국 현지 공장 가동률이 예상보다 부진하다. 사드 보복으로 화장품업계가 긴장감 넘치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그러다보니 향후 중국 특수는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미국의 투자가 워런 버핏은 “썰물

사드 배치 발표(2016년 7월 8일) 이후 335일이 지났다. 중국의 사드 보복 시나리오는 치밀하며 계산적이다. 여론전-인적 교류 제한-경제 보복 등이다. 정경일치의 합작으로 사태를 예의주시하며 유리한 방향으로 몰고 간다. 중요한 제일순위는 자국내 여론 동향이며 국익 우선을 놓고 힘(정치·외교·군사)으로 상대국을 압박한다. 그동안 중국 정부의 대응은 등가 대응(tit-for tat) 원칙을 따랐다. 사드 배치가 한 단계 나가면 중국의 보복도 한 단계 수위가 높아졌다. 최초의 보복은 ‘여론전’이다. 중국의 언론은 ‘사실’ 보다 ‘진실’을 전달하는 것을 사명으로 한다. 그런데 그 진실은 ‘무오류의 공산당이 결정하는 진실’이다. 중국 공산당 언론교육 문건의 내용이다. 여론전은 관영매체(환구시보 등)를 동원해 전쟁상황을 가정한 사드 폭격론까지 들먹이며 심리전을 펼친다. 막말은 기본이다. 이번에는 인민일보까지 나서 한국인 기고문을 실어 ‘이이제이(以夷制夷)’ 효과를 노리기도 했다. 이후부터는 인적 교류를 제한했다. 중국 비자 받기가 어려워졌고 중국 주재 한국대사는 인터뷰도 취소됐다. 행사 참석은 물론 중국 유력인사의 한국 방문 취소가 줄을 이었다. 3월 15일부터는

1년여 동안 중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사드 보복이라고 말하진 않지만 사드 보복은 계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중국의 특수한 시스템에 그 해답이 있다. 먼저 중국은 시장경제가 아니다. 민간 부문에 조직적으로 침투한 중국 공산당은 민간기업의 절반 이상을 장악했으며, 대기업일수록 당과 정부의 통제가 강력하다. 즉 현재의 중국 경제는 공산당 정부가 민간기업을 합병한 ‘민관복합체’인 셈이다. 2015년 통계에 따르면 중국 내 비국유 민간기업의 52%가 사내에 공산당 부서를 두고 있다. 외국기업이나 외국계 NGO 에서도 공산당 부서 존재를 쉽게 찾을 수 있다. 한한령이나 중국관광객 방한 금지 등 공식적으로 문서 없이 구두 전달로만 해도 사드 보복이 가능한 이유다. 롯데마트에 대한 일부 중국인들의 행패는 지극히 계산적이다. 이 때문에 중국내 화장품업체들이 사드 관련 소식에 쉬쉬하는 분위기는 언론에 노출됨으로써 반감을 일으키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다. 둘째 K뷰티는 K컬처를 업고 소비자들을 파고들었다. 중국은 문화에 대한 관점이 우리와 다르다. 문화는 ‘사업’으로 중국 공산당과 정부의 이데올로기 전파를 수행한다. 그 하위개념이 ‘산업’이다. 광전총국이 ‘중국 비하’나 ‘